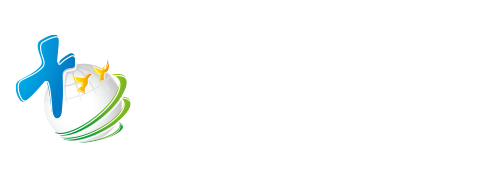한국교회사 제 7장 한국 교회의 수난사-2
3. 교회 분열의 징조
1930년대부터 분열의 징조가 생김. * 징조는 지방적 요소와 신학적 요소
장로교 : 평양을 중심으로 관서지방이 장로교가 많았다. 이곳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었다.
1911년 연희전문학교 보조문제로 총회를 열었는데 평양 중심의 교회들은 이 학교가 남쪽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보조를 반대했다.
1934년에 와서는 북쪽에서 남쪽의 총재들에게 진보 또는 근대주의자들이라고 비난 이에 맞서 남쪽은 북쪽교회에게 교회 전제주의자들이라고 혹평하였다. 그당시 미국과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신학의 깊이와 넓이가 달랐다. 이들은 너무나도 근본적인 한국신학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 그래서 평양 신학교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싫어함. 평양신학교는 같은 교단의 사람이라도 유학생은 별과에 들어가 공부를 시킨후 목사로 만들었다.
감리교 : 1930대에 제 1차 총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채택한 것이 "기도교의 근본원리가 시대를 따라 다른 형식으로 표명되었고...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교리적 체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그를 따르는 다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회 조건은 신학적이기 보다는 도덕적이요 신령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감리교는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신학교의 당시 교장이었던 박형용박사와 그리고 숭인 상업학교의 김재준 박사는 그 당시 신학논쟁의 거두들이었다. 박형용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극보수적인 신학교수의 영향을 받아 성서 무오설과 축자 영감설의 교육을 받았다.
김재준은 같은 곳에서 공부하였는데 박씨와는 달리 자유주의적이었다. 그는 한국교회 신학의 부재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 논쟁이 계속되다가 1934년과 1935년 장로교 총회의 문제로 대두함.
김영주 : 모세 5경 저작설 부인 (박형용은 이에게, 스스로 목사됨을 거절하는 것 이라 함)
김춘배 : 여권운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함.(박씨는 이를 징계에 처함이 옳다고 했다)
1935년 Abingdon 주석이 나왔을 때 감리교의 류형기 감독이 그것을 편집, 번역하였다. 이 일을 채필근, 한경직, 송창근이 같이 했는데 이 책이 아주 자유주의적이어서 번역한 자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Abingdon주석을 교인들로 하여금 사지도, 보지도 못하게 함. 점점 신학적으로 개방적이 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