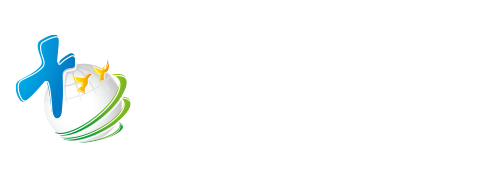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The Heidelberg Catechism A.D. 1563) 제 28주일
제 75문 :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답 :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1).
첫째,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 76문 :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2).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3).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4)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인 것입니다5).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6).
제77문 신자들이 실제로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자기 몸과
피로 신자들을 새롭게 하고 살지게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우리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고전 10:16-17)"
_____________
1) 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4; 누가복음 22:19,20; 고린도전서 11:23-25
2) 요한복음 6:35,40,50-54
3) 요한복음 6:55; 고린도전서 12:13
4) 사도행전 1:9-11; 고린도전서 11:26; 골로새서 3:1
5) 고린도전서 6:15-17; 에베소서 5:29,30; 요한일서 4:13
6) 요한복음 6:56-58; 15:1-6; 요한일서 3:24
============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성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서 앞부분만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만 생각하고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매우 공리주의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에 나아오지 않으면 주님의 징계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찬에 참여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살핀다는 명목으로 뒤로 물러서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분별하고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살핀다고 하면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을 ‘사회적인 관계’에서 생각합니다. 주님의 상에 나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살필 때에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지만 주위의 사람을 의식하여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찬 상의 주인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면서 그 공효를 덧입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찬 상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주인인 예수님께 대하여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의 제사를 이루시고 그 공효를 입혀 주시려고 나아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주님의 초청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식(外飾)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주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찬 예식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를 과시하려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나의 믿음의 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주님의 상에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완성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합니다.
성경에서 ‘기념한다’는 말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현충일에 사이렌이 울리면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하면서 기념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을 회억(回憶)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우리 가족을 그 안에 넣고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이 떼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서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살을 표시하는 것이고, 잔에 붓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께서 속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에서 식탁의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성신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입혀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의 생명이 활발하게 발휘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때에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크게 돌이키고 참회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믿음의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는 잔잔한 기쁨도 함께 누립니다.
성찬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눅 22:18)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정하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마지막 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고 가르칩니다. 이 점에서 성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가리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기대하게 합니다.